“밥해줄게, 밥 먹으러 와.”
요즘 듣기 어려운 말이라고 한 남자 배우가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정말 그렇다.
밥을 직접 해서 차려 놓고 먹으라고 하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 그것도 같이 산 학창시절에나
들어봤지, 성인이 되고 독립한 이후로는 1년에 한두
번 고향에나 방문해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배우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덧붙인다.
밥해준다는 말이,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이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이란다. 새삼 생각해 보니
아무한테나 밥을 해주고, 먹으러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얼마 전까지 시간 여유가 많을 때 집에서 빵을
구웠다. 예전부터 홈베이킹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계속 미루지만 말고 진짜 해보자 싶었던 거다. 이미
에어프라이어를 교체할 때 오븐 겸용으로 준비도
해뒀고 밀가루, 설탕 같은 각종 재료만 있으면
문제없겠다 싶어 시작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동영
상을 참고해 만들기에 돌입했다. 카스테라부터
시작해 바나나 파운드케잌, 옥수수빵, 스콘, 마들렌,
휘낭시에 등 여러 종류를 시도해 봤다. 내 입맛에는
제법 그럴듯하다 싶다. 그런데 만들어서 내가 먹은
적은 사실 별로 없다. 대부분 가까운 지인에게 나눠주
고,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전날에 만들어서 작은 선물
로 주었다. 받은 사람들이 빵을 먹어보고 맛있어하고,
행복해하면 그게 더 즐거웠다. 그래서 몇 달을
베이킹에 빠져 살기도 했다.

음식을 해주는 기쁨은 그때만 느낀 게 아니다.
베이킹을 하기 전에는 가끔 시간이 될 때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했다. 파스타, 수육, 콩나물 불고기,
메밀 비빔면 같은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실 누군가 집에 방문하는 걸 번거롭게만 생각했던
나인데, 어느 순간 내가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초대했
다. 내 성격이 변한 것일까? 그건 아닌 듯하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집도 생겨
가능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은
사람들을 불렀다. 음식에 들인 정성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인 거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나에게 집으로 불러
밥을 해준 이는 없을까? 다행히도 있다. 최근에
한 선배가 주말에 잠깐 일을 하고 돌아가려는 나를
붙잡았다.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는 거다.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예전에
선배랑 가끔 가던 고깃집에서 포장해온 갈비가
있다고 구워 준다는 게 아닌가. 왠지 선배가 엄마처럼
말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선배에겐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당연히 엄마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듯하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선배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혼자 사는 후배가 혼자 밥을 해서 혼자 먹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내 손으로 지은 밥 한 끼 해먹이자고 생각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사무치게 고마워진다.
by 권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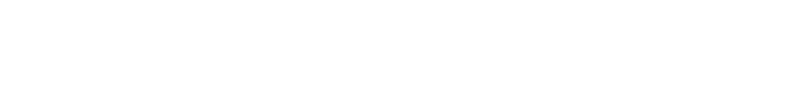
“밥해줄게, 밥 먹으러 와.”
요즘 듣기 어려운 말이라고 한 남자 배우가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정말 그렇다.
밥을 직접 해서 차려 놓고 먹으라고 하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 그것도 같이 산 학창시절에나
들어봤지, 성인이 되고 독립한 이후로는 1년에 한두
번 고향에나 방문해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배우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덧붙인다.
밥해준다는 말이,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이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이란다. 새삼 생각해 보니
아무한테나 밥을 해주고, 먹으러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얼마 전까지 시간 여유가 많을 때 집에서 빵을
구웠다. 예전부터 홈베이킹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계속 미루지만 말고 진짜 해보자 싶었던 거다. 이미
에어프라이어를 교체할 때 오븐 겸용으로 준비도
해뒀고 밀가루, 설탕 같은 각종 재료만 있으면
문제없겠다 싶어 시작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동영
상을 참고해 만들기에 돌입했다. 카스테라부터
시작해 바나나 파운드케잌, 옥수수빵, 스콘, 마들렌,
휘낭시에 등 여러 종류를 시도해 봤다. 내 입맛에는
제법 그럴듯하다 싶다. 그런데 만들어서 내가 먹은
적은 사실 별로 없다. 대부분 가까운 지인에게 나눠주
고,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전날에 만들어서 작은 선물
로 주었다. 받은 사람들이 빵을 먹어보고 맛있어하고,
행복해하면 그게 더 즐거웠다. 그래서 몇 달을
베이킹에 빠져 살기도 했다.
음식을 해주는 기쁨은 그때만 느낀 게 아니다.
베이킹을 하기 전에는 가끔 시간이 될 때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했다. 파스타, 수육, 콩나물 불고기,
메밀 비빔면 같은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실 누군가 집에 방문하는 걸 번거롭게만 생각했던
나인데, 어느 순간 내가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초대했
다. 내 성격이 변한 것일까? 그건 아닌 듯하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집도 생겨
가능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은
사람들을 불렀다. 음식에 들인 정성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인 거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나에게 집으로 불러
밥을 해준 이는 없을까? 다행히도 있다. 최근에
한 선배가 주말에 잠깐 일을 하고 돌아가려는 나를
붙잡았다.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는 거다.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예전에
선배랑 가끔 가던 고깃집에서 포장해온 갈비가
있다고 구워 준다는 게 아닌가. 왠지 선배가 엄마처럼
말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선배에겐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당연히 엄마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듯하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선배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혼자 사는 후배가 혼자 밥을 해서 혼자 먹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내 손으로 지은 밥 한 끼 해먹이자고 생각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사무치게 고마워진다.
by 권은경